통역 훈련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들도 다 전직 통역가였고, 아주 노련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각 언어별로 통역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공통된 원리만 가르친 셈입니다. 그런데 통역 훈련을 받으며 제가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크나큰 간격
실습 시간에 각 언어별 통역 실습을 클래스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어, 불어 등을 통역하는 분들은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상대방 말이 끝나자마자 심지어 어떤 때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막 통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또 다른 한국분은 그게 안 됩니다.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거의 반대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순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adical re-formulation이죠. 예컨대 “너 잘났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문장을 통역하려면 그저 의미(말한 이의 의도)만 붙들고 문장을 완전히 새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기 쓰인 단어 중에 영어로 치환해서 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서구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야 않겠지만, 동아시아어와 비교하면 직접적 치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치환만 해도 의미는 어느 정도 통하고요. 이러니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지요. (물론 99%의 경우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이 아니라 consecutive interpretation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일이 초 늦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런 문형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지요.)
미군들에게 세계 각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어가 미군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제게는 놀랍지 않습니다. 일본어 통역 후보가 있었다면 아마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와 영어(그리고 다른 서구어)와의 간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언어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언어를 각각 따로 배우고, 그 둘을 나중에 연결하는 식으로 통역과 번역을 공부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어와 영어를 따로 공부한 셈입니다. 단어를 한국어 단어와 연결지어 외우거나, 문장을 번역하는 기술 따위는 배우지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모국어니 그냥 집과 학교에서 배웠고 영어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식으로,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무조건 영어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게 동아시아 언어의 통역과 번역 훈련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역가는 만물박사?
통역 훈련을 받는 동안 느낀 또 하나의 당혹감은, 제가 거의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통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저는 착하게 살아서(ㅋㅋ) 법원 근처에도 가 보지 않았는데 재판하는 상황을 재연하면서 훈련을 하니까 무슨 용어를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글로서리를 정리한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나누어주고 중간중간에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외운다는 것이 영한 단어장을 외우는 것은 아니고 영영 사전을 외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를 겨우 다 외우고 나면 또 다른 분야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가 사람 몸의 여러 장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다 알게 된 건 바로 그때입니다. 시험 잘 통과하려고요.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실제 통역에서 사용될 말이 어디 글로서리에 들어있는 단어뿐이겠습니까? 게다가 한 분야가 겨우 끝나면 바로 다른 분야로 넘어가 또 외우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정말 이런 걸 다 외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 때 강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통역하다가 사전 찾아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진도를 빼며 외우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번역에는 그런 즉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하다 모르면 컨트롤 + D 하면 짠 나옵니다. (플루언시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역할 때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겁이 나더군요.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자세히 나지는 않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 강사가 가르쳐 준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 일단 글로서리 열심히 공부해라
- 어떤 분야에 특화해서 그 분야의 전문통역가가 되어라
- 그래도 모르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를 말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막상 통역을 시작하고 나서 저런 상황에 봉착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급하면 찾아보려고 가방에 늘 전자사전을 가지고 다녔지만 꼭 써야 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볼 때와는 달리 실제 상황 속에서는 맥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어쩌다 전문용어를 몰라서 호주머니에서 전자사전 꺼내 찾아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용어를 정확히 통역하려는 성의이고 전문가다운 겁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은 이렇습니다. “통역을 잘 하려면 만물박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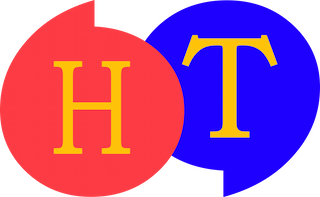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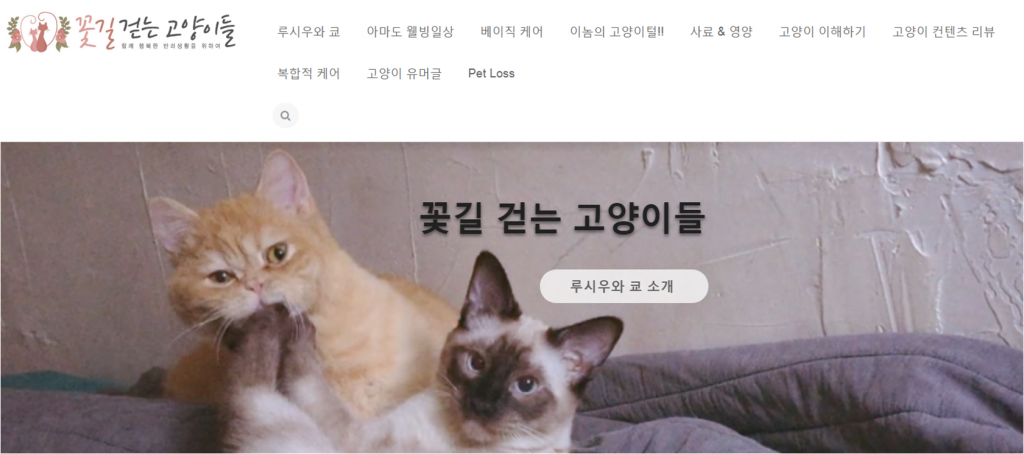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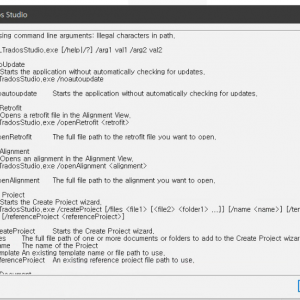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모르는걸 찾아보는게 부끄러운건 아니라는 말씀에 위로받고 세가지 팁 새겨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