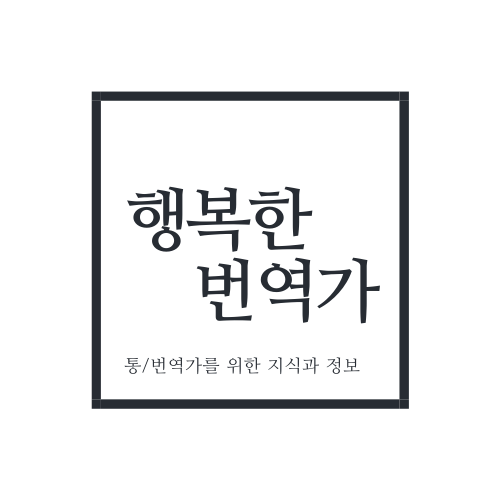이번 레슨에서는 한글 바로쓰기의 첫 번째 레슨으로서 띄어쓰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띄어쓰기는 쉬운 것 같지만 실은 까다롭고 또 애매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블로그 포스트에서 썼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번역료를 정할 때 단어당 얼마로 정하지만(per word rate)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인천공항국제화사업의 미래방향에대한 재고’를 보면 19글자입니다. 저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못되도 10단어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영 번역을 할 때는 per character rate로 계약을 하고 다른 분들께도 늘 그렇게 하도록 권유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도 많은 한글 문서에서 한글 띄어쓰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문서도 그렇고 심지어 학문적인 글쓰기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안 할 수는 없죠?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인용은 한글 맞춤법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참 명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띄어쓰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한글에서 무엇이 단어이고 무엇이 단어가 아닌지 잘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조사, 불완전명사, 단위 명사, 보조 용언 등등), 다른 하나는 위의 원칙이 어디까지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참 애매하죠?
예컨대, ‘띄어쓰기’는 붙여 써야 하고 ‘띄어 쓰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으므로 띄어 써야 한답니다. 또 ‘띄어쓰기’와 거의 유사하고 의미상 대칭이 되는 ‘붙여 쓰기’는 떼어 써야 한답니다. ‘끌어내다’는 합성어로서 붙여 쓰고 ‘밀어 넣다’는 합성어가 아니라서(다시 말해서 아직 합성어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띄어 써야 한답니다. 이 정도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지경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숫제 띄어쓰기를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의 행정적인 사항들이 우리말 띄어쓰기에 대한 전적인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되겠죠. 더군다나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번역가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다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띄어쓰기 정복의 첫 번째 복병: 조사
제가 생각할 때 띄어쓰기 문제의 핵심은 조사입니다. 조사를 제외하면 다 떼어 쓰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예외와 헷갈리는 것들은 일단 제쳐두고 원칙을 일단 튼튼히 익힌 후에 예외를 좀 더 살피도록 하지요.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여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써야 합니다(한글 맞춤법 제 1장 제 2항).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 조사이고 무엇이 조사가 아닌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박스 안의 내용은 조사의 종류를 분류한 것을 제가 간추린 것입니다. 출처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irror.enha.kr/wiki/%ED%95%9C%EA%B5%AD%EC%96%B4%EC%9D%98%20%EC%A1%B0%EC%82%AC
|
2.1. 격조사 격조사는 그 조사가 붙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갖는 문법적 기능을 책정하는 역할을 한다. 2.1.1. 주격조사: 이/가, 께서, 에서, (서) 예시: 닭이 꼬꼬댁 울고, 오리가 꽥꽥 운다. 2.1.2. 서술격 조사: 이-(으뜸꼴: 이다)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 활용이 된다. 다른 조사들은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변어에 속하지만 이다 같은 경우에는 조사 인데도 활용이 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국문법상 아예 다른 범주로 묶여 있다.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을 때는 생략되지 않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을 때는 생략될 수 있다. 2.1.3. 관형격 조사: 의 다른 말을 꾸미는 관형어가 되게 만든다. ‘의’하나 뿐이다. ‘~의 ~의 ~의’ 같은 식으로 의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지나치게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번역투에 의한 것으로, ‘의’를 빼고 써서 말이 된다면 빼고 쓰는 것이 좋다. 2.1.4. 목적격 조사: 을/를 낱말이 타동사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 예시: 공부를 하라. 노력을 하라. 2.1.5. 보격 조사: 이/가 앞의 체언을 보어가 되게 만든다. 주격조사와 형태는 같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 보격조사는 이/가만 인정하며 반드시 되다, 아니다 와 같은 단어가 뒤에 와야 한다. 즉 ‘되다/아니다’의 유무를 토대로 보격 조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2.1.6. 부사격 조사: 에/에게, 에서/서, 보다, 로, 로서, 로써, 와/과, 으로, 라/라고 앞의 체언을 부사어가 되게 만든다. 2.1.7. 호격 조사: 아/야, 여/이여/이시여 명칭과 붙어서 그 명칭을 부르는 호명이 되게 만든다. 2.1.8. 보편 문법에 따른 격조사의 분류 20세기 후반, 보편 문법 및 심층 언어학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한국어의 격조사를 위의 학교 문법이 아닌 보편 문법의 심층격 이론에 따라 재분류하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심층격의 격분류는 체언과 서술어의 문법적 관계보다는 주로 의미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 접속조사 와/과, 하고, 이며, 에다, (이)랑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2.3. 보조사(특수조사) 보조사(특수조사)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사를 의미한다. 격조사의 경우 격을 부여하는데 보조사는 의미를 부여한다. 아래 언급된 것 말고도 많이 있으니 찾아 보자. 2.3.1. 은/는, 도 ‘은/는’은 주격조사라고 일부 영어수업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닌 보조사이다. 예시문장을 보자. 철수는 밥을 / 밥은 / 밥도 / 밥만 먹었다.[6]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 ‘은/는’ 이 목적격 조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2.3.2. 도 추가, 강조, 양보, 의외성 등을 나타냄. 2.3.3. 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등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을 나타냄. 2.3.4. 까지, 마저, 조차 셋 모두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추가됨을 나타냄. 다만 구체적인 뉘앙스는 셋 모두가 조금씩 다른데…
2.3.5. 야, 야말로 강조의 의미. 2.3.6. 나 비교, 불만, 어림, 강조 등의 의미. 3.받침에 따라 바뀌는 조사: 은/는, 이/가, 을/를, 와/과, 아/야, 여/이여 앞의 낱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 이, 을, 과, 아, 이여’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는, 가, 를, 와, 야, 여’를 쓴다. 예시: 심봉사는 벼슬이 없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으로’와 ‘로’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 앞 말이 받침 없이 끝나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로’, 앞 말이 ㄹ 외의 받침으로 끝난다면 ‘으로’가 붙는다.
|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해외에서 자라난 한국인 2세들이 영한 번역을 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가 팍~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어, 정만 만만치 않습니다. 조사만 해도 이러니….
일단, 위와 같은 조사들은 앞의 체언에 붙여 써야 한다는 것 기억 하시고요. 이제 연습으로 조사를 잘 붙여 쓰는지 문제를 한 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들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보십시오.
① 너야 말로 나쁜 놈이다.
② 칭찬은 커녕 욕만 얻어먹고 왔다.
③ 너 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일을 모른다.
④ 우리 같이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은 다 그분 덕이다.
⑤ 요즘 젊은이 치고 예절 바른 놈 하나도 없습디다 그려.
⑥ 그이도 나름 대로 생각이 있겠지.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너야말로 나쁜 놈이다.
② 칭찬은커녕 욕만 얻어먹고 왔다.
③ 너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일을 모른다.
④ 우리같이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은 다 그분 덕이다.
⑤ 요즘 젊은이치고 예절 바른 놈 하나도 없습디다그려.
⑥ 그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출처: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4268)
모두 아홉 군데 고쳐야 하는데, 다 맞추신 분은 실력이 정말 무시무시하신 분입니다.
2. 띄어쓰기 정복의 두 번째 복병: 의존 명사(불완전 명사)
의존 명사는 명사이긴 한데 그것 자체로 완전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수식하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유
- 할 수 없이 참고 견뎠다: 방법
-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서운해 했지: 사실
- 떠나간 지 한참이 지났지만: 기간
저런 것들은 좀 모자라는 명사들이지만 그래도 명사이니까 띄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런 의존 명사들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조사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즉, 저런 글자를 보면 붙여 쓰고 싶은 강렬한 욕구 내지 의혹이 생기죠. 그뿐 아닙니다. 한 술 더 떠서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조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독립 단어인 의존 명사인지 아니면 조사인지를 분간해 내는 일은 정말 번역가의 예민한 언어 감각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예들을 보면서 다음 요소들이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즉, 앞의 말에 붙여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띄어 써야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다 붙여 놓았습니다.)
문제:
-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 그밖에도 많은 회사들이 IMF 때 도산했다.
정답:
-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이라는 뜻을 표현해 주는 조사. 뜻이 그렇다 보니 그 뒤에는 늘 부정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I have no one but you to rely on.)
- 그 밖에도 많은 회사들이 IMF 때 도산했다. (어떤 한도에 들지 않는 바깥이란 의미의 의존 명사. 뒤에 부정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Many other companies went bankrupt during the IMF crisis.)
문제:
-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에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에서 힘들게 지낸다.
- 공항에 도착하는대로 일단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려라.
정답:
-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에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에서 힘들게 지낸다. (‘나름의 방식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조사. 예문에서 보듯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있을 때 이런 조사를 써서 공통점을 병치시킵니다. 즉, 남편이 힘든 이유와 방식, 그리고 아내가 힘든 이유와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각자의 방법으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The husband suffers outside and the wife suffers at home in her own way.)
-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일단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려라. (‘즉시’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 As soon as you…)
문제:
- 나만큼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 아픈만큼 성숙한다.
정답:
- 나만큼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정도가 비슷함’을 나타내는 조사. 명사 뒤에 붙어 있고, 정도가 비슷함을 나타내면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의 as ~ as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Who worked as hard as I did?)
-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의존 명사. 조사일 때는 명사 뒤에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관형사의 꾸밈을 받고 있으니 비록 조사일 때와 뜻은 비슷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어엿한 명사입니다. 뜻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무엇에 비례하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You will get wiser in proportion to your suffering.)
문제:
-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아들은 굳이 밖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 다른 건 몰라도 노는데는 선수다.
정답:
-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아들은 굳이 밖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런데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의 일부. Although it is rainy and windy, my son insists on going out to play.)
- 다른 건 몰라도 노는 데는 선수다. (‘방면’이란 뜻을 가진 의존 명사. When it comes to games, he is an expert.)
문제:
- 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 마라.
- 한국을 떠난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정답:
- 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 마라.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의 일부. I am not sure who you are but you are crossing the line.)
- 한국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기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15 years have passed since I left Korea.)
벌써 힘드시죠? 그래도 위의 문제들이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헷갈리는 것들은 사실상 다 망라한 것이니까 힘을 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3. 띄어쓰기 정복의 세 번째 복병: 단위 명사
우선, 단위 명사는 다음 예시에서 보듯이 일단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 두 개
- 나무 한 그루
- 고기 두 근
- 말 두 마리
- 물 한 모금
- 일 미터
- 옷 한 벌
- 스무 살
- 백 만원
- 신 두 켤레
그러나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나올 때는 붙여 씁니다.
- 3년 6개월 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서
- 2주간 물만 먹고 지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우리말 뒤에 바로 따라 나올 때는 띄어 씁니다.
- 삼 년 육 개월 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서
- 이 주간 물만 먹고 지냈다.
이것도 눈에 힘 주고 보면 이해가 되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4. 띄어 쓰기 정복의 네 번째 복병: 예외
이 단원 제일 앞에서 언어가 복잡하고 규칙은 원칙에 불과해서 어렵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실컷 조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뗀다고 해 놓고 그 예외를 말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머리 속에 쏙 집어 넣을 수 있는 한 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예외를 말입니다. 이것들을 예외적으로 붙여 쓰는 이유는, 본래는 [관형사 + 의존 명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자주 쓰이게 되자 마침내는 한 낱말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도 본래 today는 to day였다가 그것이 to-day로 변하고 마침내 오늘날에는 today가 한 단어로 굳어진 것과 같습니다. Yesterday도 마찬가지. Under와 way도 워낙 친하게 지내다가 마침내는 underway가 한 단어로 굳어지고 심지어는 under way와는 구별되는 뜻을 지니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 너무 이를 뿌득뿌득 갈지 마시고, 눈에 힘주고 한 번 일별해 보십시오. ‘한 낱말로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상기하면서요. 아래 목록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4667§ion=§ion2=
| 의존 명사지만 붙여 쓰는 경우들- 것: 이것, 저것, 그것, 이것저것, 요것, 조것, 고것, 요것조것, 아무것, 갓난것, 어린것, 젊은것, 늙은것, 미친것, 상것, 쌍것, 아랫것, 봄것, 여름것, 가을것, 겨울것, 공(空)것, 군것, 까짓것, 날것, 단것, 들것, 딴것, 별것, 물것, 새것, 생것, 숫것, 오사리잡것, 옛것, 잡것, 탈것, 풋것, 햇것, 헌것, 헛것- 쪽: 이쪽, 저쪽, 그쪽, 이쪽저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 양쪽, 한쪽(‘一方’의 뜻일 때. ‘사과 한 쪽’은 띄어 쓴다), 반대쪽, 오른쪽, 바른쪽, 왼쪽, 맞은쪽, 겉쪽, 바깥쪽, 안쪽, 옆쪽, 양지쪽, 음지쪽- 번(番): 이번, 저번, 요번, 한번(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한다는 뜻으로 쓸 때) 골백번, 이전번, 그전번, 다음번, 삼세번, 지난번, 전전번- 편(便): 이편, 저편, 그편, 이편저편, 건너편, 교통편, 뒤편, 맞은편, 바른편, 반대편, 상대편, 양편, 오른편, 왼편, 자기편, 한편- 이: 이이, 저이, 그이- 분: 이분, 저분, 그분, 여러분 |
5. 띄어 쓰기 정복의 다섯 번째 복병: 성과 이름, 성명과 호칭
이번에는 문제부터 하나 풀고 시작하죠.
성이 ‘이’씨이고 이름이 ‘정국’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중 맞는 표기법은 어떤 것일까요?
- 이 정국 씨
- 이 정국씨
- 이정국 씨
- 이정국씨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이정국 씨).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성과 이름은 붙여 써야 하고 호칭과 관직명은 띄어 써야 합니다. 이름 뒤의 ‘씨’는 호칭에 해당하니까 ‘최진실 씨’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직책 / 학위 / 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 이휘소 박사
- 이주영 장관
- 이순신 장군,
- 백범 김구 선생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참 기억하기도 좋고 “역시 한글 문법은 간단해!”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1) 우선 ‘씨’는 존칭으로 쓰기도 하지만 성씨 자체를 높여 말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붙여야 합니다.
- 안동 김씨의 세도는 대단했다.
- 우리 사무실에는 박씨 성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는데요?
2) 성이 두 글자인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면 어떤 것이 성이고 어떤 것이 이름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띄어 써도 됩니다.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황보 영조
- 남궁 혁
이것으로 띄어쓰기에 대한 레슨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